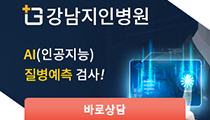종합 > 일간사회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 조종사 사망 “높은 고도서 곧바로 추락”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에서 임차한 S-76B 기종으로,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체였다. 조종사 박모 씨(73)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전날부터 총 세 차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박 씨는 25일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의성으로 이동해 한 차례 작업을 수행한 후 26일 세 번째 진화 작업을 위해 낮 12시 44분 이륙했지만, 불과 7분 만에 추락했다.
26일 경북 의성군 신평면 교안리에서 산불 진화를 위해 출동한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헬기는 강원도에서 임차한 S-76B 기종으로, 1995년 미국에서 제작된 노후 기체였다. 조종사 박모 씨(73)는 4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전날부터 총 세 차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상태였다. 박 씨는 25일 오후 강원도 인제에서 의성으로 이동해 한 차례 작업을 수행한 후 26일 세 번째 진화 작업을 위해 낮 12시 44분 이륙했지만, 불과 7분 만에 추락했다. 목격자들은 헬기가 전선에 걸린 후 추락했다고 증언했으며, 이를 토대로 산림당국은 조종 실수 또는 기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로 인해 산불 진화 작업이 더욱 어려워지는 가운데, 산림청은 오후 1시 30분부로 전국 산불 현장에 투입된 모든 헬기의 운항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내렸다. 산림청 관계자는 “조종사들이 사고 소식에 동요하고 있고, 현장에 연무가 심해 추가 사고 발생 위험이 커 일시적으로 운항을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헬기 운항이 중단되면서 지상 대원들만으로 산불을 진화해야 했고, 이로 인해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헬기가 공중에서 물을 뿌려줘야만 산불이 빠르게 진화될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물리적으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산림청은 2시간 뒤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사고 기종을 제외한 나머지 헬기를 순차적으로 다시 투입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산불 진화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 수가 부족하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산림청이 보유한 산불 진화 헬기는 총 50대로, 이 중 담수량 8000L 이상을 자랑하는 대형 헬기인 S-64 기종은 단 7대뿐이다. 나머지는 담수량 3000L의 KA-32(29대), 2000L의 KUH-1(3대), 600~800L의 소형급 헬기(11대) 등이다. 특히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KA-32 헬기 8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품 수급이 막히면서 운용이 중단된 상태다. 이로 인해 실제 가용 가능한 헬기는 42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정비 문제로 인해 전부 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산림청은 물탱크 용량이 1만 L에 달하는 대형 헬기 CH-47 ‘치누크’ 도입을 추진 중이지만, 당장 도입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불 진화 작업이 장기화되면서 지상 진화대원들의 피로도 역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한 소방관이 탈진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으며, 현장에 투입된 대원들은 극심한 체력 소모를 호소하고 있다. 한 소방대원은 “뜨거운 불길과 강한 바람이 맞물려 체력이 급격히 소진된다”며 “진화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현기증이 났는데, 비탈진 곳이라 정신을 잃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진화대원은 “나흘째 하루 10시간 이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일출부터 일몰까지 작업하다 보니 몸이 탈진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산불 진화 지원을 위해 헬기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7일 주한미군 소속 UH-60 ‘블랙호크’ 2대와 CH-47 ‘치누크’ 2대 등 총 4대의 헬기를 경남 산청 산불 진화에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UH-60 블랙호크는 2019년 강원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도 투입된 바 있으며, CH-47 치누크 역시 2022년 동해안 산불에서 진화 작전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산불 진화 시스템이 심각한 장비 부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형 산불 진화 헬기 확충과 조종사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환경연구부 이병두 부장은 “산불 진화 헬기 부족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조종사를 육성하고, 드론(무인기) 등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산불 진화 과정에서 헬기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는 대형 산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책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특히 기후 변화로 인해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 진화 장비를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조종사 및 진화대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이번 사고는 노후 헬기의 안전 문제를 다시 한번 부각시켰다. 현재 산림청이 운영 중인 상당수의 헬기가 제작된 지 수십 년이 지나면서 기체 결함이나 운항 안정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헬기의 지속적인 정비 및 교체가 필수적이며, 노후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최신 기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까지 산불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가운데, 사고 이후 산림당국은 진화 작업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인 헬기 투입과 지상 병력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헬기 부족과 진화대원의 체력 고갈 문제가 겹치면서 작업 속도는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산불 진화 장비의 확충과 조종사 양성, 안전 대책 마련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앞으로도 대형 산불 발생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